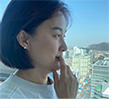
첫사랑Ⅰ- 봄.
눈 오던 추운 밤, 꽃잎이 흩날리던 봄밤.
기다리다 지쳐 한껏 멋을 부린 차림새에 괜한 심통이 날 때쯤 그 사람은 나타났다.
한 시간을 넘게 서서 그가 어느 방향에서 나타날까 사방팔방 돌아보다가, 나오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다가, 간단치 않은 성격이 불안하다가 …. 마음은 한시도 쉬지 않고 그를 기다리느라 분주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날 수 록 점점 더 불안하게 움직이던 눈동자. 생각해보면 기다림은 늘 나의 몫이었다.
그러다가 저 멀리 익숙한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을 때에는 썰물처럼 걱정은 쓸려 내려갔다. 점점 더 다가오는 사람. 왜소한 체구에 모자를 눌러 쓴 검은 그림자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온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입이 귀밑까지 걸린 반가운 얼굴이 나타나면 나를 괴롭혔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언제나처럼 초라한 옷차림에 구겨진 청바지를 입고선 마치 세상을 방랑하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내 앞에 서 있던 사람. 그럼 그가 또 다시 방랑하던 그 길로 휭 돌아설까봐, 내 앞에서 세상을 얻은 듯 웃고 있는 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찰나마저 아쉬운 시간이었다.
서울역 앞에서 값싼 제육볶음을 먹고 싸구려 커피를 마시며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는 주변에서 가장 쾌적한 서울역 안으로 들어갔다. 가난한 연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백화점 스톨에 앉아 상표도 없는 커피를 홀짝이며 한손은 꼭 잡고 오래도록 얘기하고 서로를 바라봤다. 백화점이 닫을 시간엔 어쩔 수 없이 노숙자들과 함께 광장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그가 타고 떠날 기차 시간을 기다렸다.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미쳐 더 하지 못한 말이 있었던가? 다음의 계획은 잡았던가? 주고 싶은 건 다 줬던가? 손으로 전해지던 온기는 충분히 나눴던가? 각자의 아쉬움을 부여잡고 플랫폼에서 이별을 했다. 다시 볼 수 있는데도 언젠가는 헤어질 걸 알았을까. 언제나 그와 있을 땐 마음이 바빴다.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랑이었다.
끝날 듯 말듯 6년여를 부여잡고 결국은 내가 먼저 끝을 알렸다. 그를 보내고 나서 2박 3일간 몸살을 앓았다. 익숙했던 내 몸의 온기를 빼내는 것이 그런 것이었나보다. 거짓말처럼 2박3 일이 지나고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덤덤하게 일상을 살았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공부해서 취업하고 월드컵도 보고 또 연애하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그 와중에도 한동안은 계절과 함께 찾아오는 그와의 추억 때문에 철마다 앓았던 것 같다. 5 년쯤 지나고부터 추억의 향기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며 나는 또다른 사랑을 했다.
늦은 밤 맥주 몇 잔에 취기가 올랐던 어젯밤, 버스정류장 가로등 아래 나타난 낯익은 그림자에 20년 전의 그 친구가 문득 생각났다.
내 인생의 밑천은 고작해야 찐한 첫사랑 정도. 20대 그 기억에 참 오랫동안 행복하고, 아프고, 멍때렸었는데, 20여년이 지나니 추억도 세월을 타는지 아팠던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그래도 설렘이란 참 고약한 감정이다. 나도, 추억도, 모두가 나이 들어도 그놈의 설렘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니 말이다. 아직 내공이 부족한 탓이려니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무료한 일상에 추억으로 설렐 수 있다는 건 아직 내 안에 낭만세포만은 완전히 퇴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테니까.
세계일보 서혜진 차장

